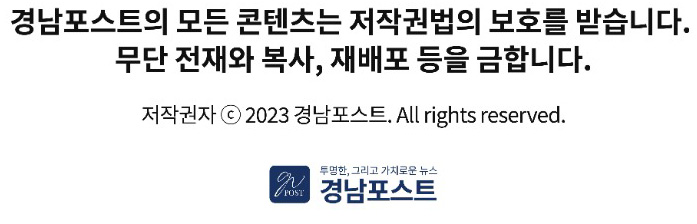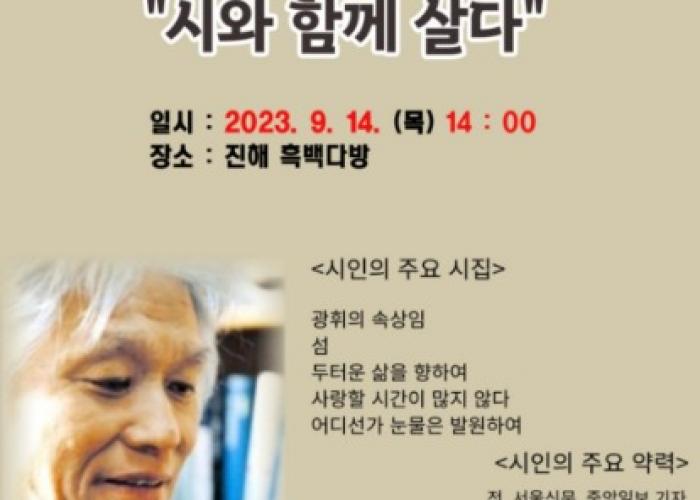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재활용품 회수율보다 처리율이 훨씬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선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처리 과정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분리 배출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며 “그런데 수거 과정에서 뒤죽박죽 섞고, 다시 재선별하는 어이없는 행정력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분리 배출을 제대로 했음에도 최종 분류 과정에서 선별되지 않으면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지킨 수칙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활용품 회수율은 86%에 달하지만, 실제 처리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리 수거는 무의미하며, 그 책임을 국민이 규범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전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리수거 이후 처리과정 공개 △재활용 공공인프라 확충 △산업체·대기업에 명확한 책임 부과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왜 개인에게만 환경을 지키라고 강요하나. 대형 유통업체, 산업체는 책임을 비켜 가나”라며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적한 “재활용품 회수율 86%, 처리율 50%”의 괴리는 국내 재활용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분리배출 참여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거된 재활용품의 절반 가까이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는 현실이 여러 연구와 현장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저조한 처리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국민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거·선별 과정에서 음식물 등 이물질이 혼입된 재활용품이 많아 상당수가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는다. 둘째, 플라스틱 등 복합재질의 경우 물리적 재활용이 어려워 실제로는 에너지 회수(소각)까지 재활용으로 집계되지만, 유럽식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6%대에 불과하다. 셋째, 재활용 처리 인프라와 선별장 자동화, 공공투자 부족 등 시스템적 한계로 인해, 분리수거 후에도 상당량이 제대로 분류·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개인에게만 환경 책임을 전가한다”는 김 의원의 비판은 최근 정책·학계에서도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대기업·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과 재활용 의무 확대, AI·스마트 선별장 등 첨단기술 도입, 재활용도움센터·클린하우스 등 공공 인프라 확충, 산업계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다각적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부 선진국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등 구조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소각·매립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통계방식을 개선하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분리배출·선별·재활용 전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기업·유통업체·배달플랫폼 등 산업계 책임 강화, 공공 선별장·재활용센터 확충 등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결국,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의 분리배출 노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산업계의 책임 강화, 공공 인프라 투자, 첨단 선별·처리기술 도입,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근본적 시스템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